조선시대도 국내산 안료 부족 … “중국·일본서 수입” 기록 본문
5년 만에 돌아온 숭례문, 3가지 미스터리 (중) 사라진 전통 단청 안료
중앙일보 이영희 입력 2013.01.03 00:23 수정 2013.01.03 08:12
지난달 31일 마무리 공사 중인 숭례문 2층 누각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 숭례문 내부는 조선 초기 단청의 느낌을 살려 청색과 녹색 위주로 장식됐다. 창문 위쪽의 평방(平枋·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건축 부재)에는 색을 칠하지 않고 5년 전 화마로 검게 탄 흔적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비극적인 화재 역시 숭례문 역사의 일부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김성룡 기자]
단청(丹靑)은 목조건물의 옷이다. 어떤 재질의,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건물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2월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국보 1호 숭례문은 5년 전 화재 당시에 비해 차분하고 단아해졌다. 눈에 확 띄는 강렬한 색감의 화학안료(顔料) 대신, 채도가 낮고 고풍스런 색을 내는 천연안료를 사용했다.
천연안료는 돌이나 흙, 조개껍데기 등을 곱게 갈아 만든다.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 서양의 화학안료가 수입되면서 국내 천연안료 제조 기술은 거의 사라졌다. 문화재 단청에도 화학안료가 사용된 지 오래다.
숭례문 단청작업에는 '전통기법 복원' 원칙에 따라 100% 천연안료가 쓰였다. 하지만 국내에 관련 기술이 없어 안료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국보 1호의 상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조선 초 분위기로 복원
숭례문 단청작업의 핵심은 조선 초기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조선 초 양식이 많이 반영된 1963년 복원 도면을 기초로,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과 창경궁 명정전 등 조선 초·중기 전각들의 단청을 조사했다. 청색과 녹색 위주의 수수한 색감에, 연꽃잎과 물결 무늬가 주로 쓰였다.
사용된 안료의 종류는 11가지. 이중 기둥에 칠하는 붉은 색 석간주(石間 < 7843 > )와 조개껍데기에서 나온 흰색 가루 호분(胡紛) 일부를 제외하고 청색 계열인 삼청(三靑), 붉은 계열 안료인 주홍(朱紅) 등 9가지 색을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안료에 섞는 아교 역시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다.
문화재청은 우리 고유의 기술이 실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최대한 국내산을 사용하기 위해 안료 전문가인 경주대 안병찬 교수팀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지만,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단청작업의 총책임을 맡은 중요무형문화재 48호 홍창원 단청장은 "전통안료 제조 기술을 되살려 문화재에 사용해도 될 만큼 품질 좋은 안료를 만들어내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숭례문 복원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밝혔다.
◆색깔 있는 돌과 흙 부족
조선시대에도 국내 천연안료 생산은 활발하지 못했다. 다양한 색깔의 바위나 흙이 부족해 뇌록(磊綠)·반주홍(磻朱紅) 등 서너 색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특히 붉은 색 안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당주홍(唐朱紅)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실제로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1617년)의 기록에는 창경궁 건설을 책임졌던 영건도감(營建都監·궁궐이나 성곽 등의 건축을 맡은 기관) 관리가 "당주홍 600근의 값을 헤아려보니 60동이나 되어 무역해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홍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궁궐 단청의 바탕색으로 쓰인 삼청이나 삼록(三綠) 등도 중국산이었다. 『승정원일기』 인조4년(1626년) 기록에는 명나라에서 매년 삼청이나 삼록 등을 들여왔으나 다행히 비축량이 많아 올해는 사오지 않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년)의 기사에도 검푸른색 안료인 심중청(深重靑)의 원석을 일본에서 들여왔으며, 화원을 일본에 보내 제조법을 배우게 했다는 대목이 있다.
◆천연안료 사용 늘려야
예로부터 안료는 금은에 버금갈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화학안료가 쉽게 퍼져 나간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천연안료는 재료의 희소성에 따라 같은 색의 화학안료에 비해 10배에서 수백 배까지 비싼 것도 있다. 이번 숭례문 단청에 쓰인 안료 구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다.
이번 기회에 천연안료 사용을 주요 문화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치기현 닛코(日光) 사원과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 등이 지속적으로 천연안료로 단청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건축물들에 공급하기 위해 6~7개의 전통 안료 제조사가 맥을 이어가도 있다.
문화재청 조상순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청은 외국에서 원석을 들여와 이를 안료로 제조하는 연구를 조만간 시작한다"며 "장기적으로 전통안료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그 사용 범위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영희.김성룡 기자xdragon@joongang.co.kr

천연안료는 돌이나 흙, 조개껍데기 등을 곱게 갈아 만든다.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 서양의 화학안료가 수입되면서 국내 천연안료 제조 기술은 거의 사라졌다. 문화재 단청에도 화학안료가 사용된 지 오래다.
숭례문 단청작업에는 '전통기법 복원' 원칙에 따라 100% 천연안료가 쓰였다. 하지만 국내에 관련 기술이 없어 안료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국보 1호의 상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조선 초 분위기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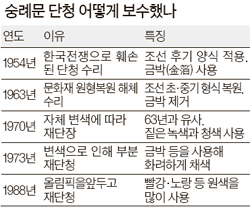
사용된 안료의 종류는 11가지. 이중 기둥에 칠하는 붉은 색 석간주(石間 < 7843 > )와 조개껍데기에서 나온 흰색 가루 호분(胡紛) 일부를 제외하고 청색 계열인 삼청(三靑), 붉은 계열 안료인 주홍(朱紅) 등 9가지 색을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안료에 섞는 아교 역시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다.
문화재청은 우리 고유의 기술이 실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최대한 국내산을 사용하기 위해 안료 전문가인 경주대 안병찬 교수팀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지만,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단청작업의 총책임을 맡은 중요무형문화재 48호 홍창원 단청장은 "전통안료 제조 기술을 되살려 문화재에 사용해도 될 만큼 품질 좋은 안료를 만들어내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숭례문 복원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밝혔다.
◆색깔 있는 돌과 흙 부족
조선시대에도 국내 천연안료 생산은 활발하지 못했다. 다양한 색깔의 바위나 흙이 부족해 뇌록(磊綠)·반주홍(磻朱紅) 등 서너 색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특히 붉은 색 안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당주홍(唐朱紅)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실제로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1617년)의 기록에는 창경궁 건설을 책임졌던 영건도감(營建都監·궁궐이나 성곽 등의 건축을 맡은 기관) 관리가 "당주홍 600근의 값을 헤아려보니 60동이나 되어 무역해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홍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궁궐 단청의 바탕색으로 쓰인 삼청이나 삼록(三綠) 등도 중국산이었다. 『승정원일기』 인조4년(1626년) 기록에는 명나라에서 매년 삼청이나 삼록 등을 들여왔으나 다행히 비축량이 많아 올해는 사오지 않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년)의 기사에도 검푸른색 안료인 심중청(深重靑)의 원석을 일본에서 들여왔으며, 화원을 일본에 보내 제조법을 배우게 했다는 대목이 있다.
◆천연안료 사용 늘려야
예로부터 안료는 금은에 버금갈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화학안료가 쉽게 퍼져 나간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천연안료는 재료의 희소성에 따라 같은 색의 화학안료에 비해 10배에서 수백 배까지 비싼 것도 있다. 이번 숭례문 단청에 쓰인 안료 구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다.
이번 기회에 천연안료 사용을 주요 문화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치기현 닛코(日光) 사원과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 등이 지속적으로 천연안료로 단청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건축물들에 공급하기 위해 6~7개의 전통 안료 제조사가 맥을 이어가도 있다.
문화재청 조상순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청은 외국에서 원석을 들여와 이를 안료로 제조하는 연구를 조만간 시작한다"며 "장기적으로 전통안료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그 사용 범위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영희.김성룡 기자xdragon@joongang.co.kr
'이탈한 자가 문득 > 풍경 너머의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좋은 나무, 나쁜 나무 (0) | 2013.01.25 |
|---|---|
| 게르하르트 리히터 (0) | 2013.01.08 |
| 정림사지 5층석탑 (0) | 2013.01.08 |
| 새해 사자성어는 '제구포신(除舊布新)' (0) | 2012.12.30 |
| 체 게바라 시와 육성 (0) | 201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