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 나의 삶 나의 시] 24
비뚤비뚤 어린 아들의 편지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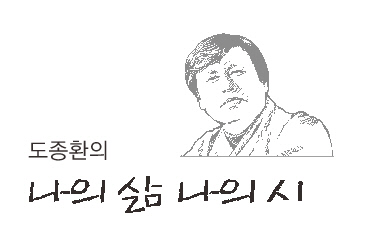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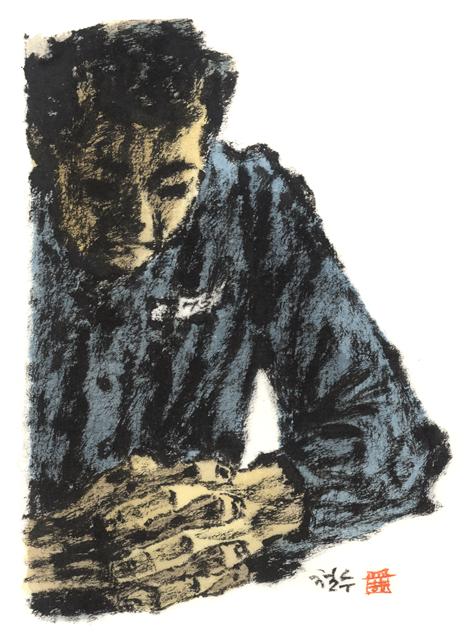

교도관의 목소리 중에 반가운 소리가 면회 왔다는 소리입니다. 저만 반가운 게 아니라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들도 덩달아 반가워합니다. 누군가 면회를 오면 먹을 것을 넣어주기도 하고, 생필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면회 오는 사람 없는 개털(처지가 곤궁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교도소에서 쓰는 은어)들에게는 일없이 진종일 쳐다보고 앉아 있는 무료한 감방생활 중에 간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면회 오는 사람들이 넣어주는 호두과자가 그렇게 맛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들어가니 거기 노 스승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학 은사이신 조건상 교수님은 학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면회실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중세국어를 가르치셨던 보수적인 학자이신데 감옥에 갇힌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해임시킨 교육감의 은사이기도 한 분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가지고 오신 두루마리를 천천히 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갈공명의 < 출사표 > 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지로 된 두루마리에 직접 세필로 먹을 묻혀 한 자 한 자 써 오셔서 그걸 읽고 계셨습니다. 제갈량이 < 출사표 > 를 써서 임금께 올릴 때처럼 천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때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의 의기와 진심으로 충직한 간언을 올리는 선비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악한 짓을 저질러 죄를 범한 자와 충성과 선행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상훈이 공평하고 도리에 밝아야 하며, 안과 밖의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제갈량은 이 글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이런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초야에 묻혀 지내다 삼고의 예로 찾아온 유비에게 감읍하여 난세에 몸을 던진 지 이십일 년이 지나 다시 스스로 전지로 나가기로 하고 눈물로 글을 올리는 제갈량의 마음 같은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 출사표 > 그 긴 글을 천천히 읽고 계시는 동안 선생 된 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목소리는 높였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학자이시라서 이런 방식으로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사님들 중에는 대학에서 하던 강의를 중단하게 하신 분도 있고(물론 그것도 공안기관의 탓이긴 하지만), 당신의 교육관과 맞지 않아 질타하고 못마땅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던 걸 생각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은 면회 온 사람과 주고받는 말을 옆에 앉아 면담록에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을 계속 읽고 있고, 한 사람은 말없이 듣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로 변하며 연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난 교수님은 다시 그 두루마리를 말아 넣어주고 가셨습니다. 말없이 면회실 밖을 돌아 나가시는 구부정한 등을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같은 방에는 어린 학생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다 들어온 갓 스무 살을 넘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교하는 여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는 못된 짓을 한 젊은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동안 구박도 많이 받고 얻어맞기도 하다가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떠돌다 결국 어린 학생들 돈을 빼앗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1심에서 5년이나 구형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며 지내다가 붙잡혀 오고 나니 본래의 보잘것없고 오갈 데 없으며 의지가지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한문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한문을 몰라 신문도 읽을 수 없어 그런다고 하면서 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만년노트를 하나 더 주문해서 거기다 중학교 1학년 한문책에 나오는 한자들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한문 책 한 페이지씩이 떠올랐습니다. 뫼 산, 내 천 같은 기본적인 상형문자에서 윗 상이나 아래 하 같은 지사문자를 차례차례 가르치고 쓰고 익히게 했습니다. 같은 재소자끼리 마룻장에 구부리고 앉아 한문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모습이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들에게도 웃기는 일로 보였을지도 모르고, 교도관들이 보기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 중에는 이 젊은이를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불러다 못살게 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를 갈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독방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꽤 오래 그에게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독방으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아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인데다 이런 일을 하며 다니느라 한글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한글을 깨쳐 비뚤비뚤한 글씨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죄 짓고 끌려온 사람에게 한문은 가르쳐 주면서 정작 제 자식에게는 한글조차 가르쳐 주지 못한 아버지로 사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남의 자식 가르치는 일 때문에 제 자식은 돌보지 못하는 것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비는 내리는데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배운 글씨로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차가운 회색 벽에 이마를 대고 그 벽을 손바닥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독방의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이런 내가 싫었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벽을 뚫고 넘어 아이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문을 발로 차고 부수어도 나갈 수 없고, 이마를 짓찧어 피를 흘려도 벽은 무너질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망연히 앉아 있다가 뾰족한 젓가락 같은 나무로 벽에 금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세로로 수없이 문질러 파서 벽에다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 넣고비 갠 일요일 아침 당신께 기도드립니다.엄마 없고 아빠마저 빼앗긴 저의 두 아이들주님, 당신께서 돌보아 주십사 하고 기도드립니다밤비에 젖은 얼굴을 털며 일어서는 무궁화꽃처럼저의 아이들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구름 걷힌 하늘의 작은 햇볕에도 들풀이 자라듯아이들이 당신 사랑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좋은 옷 맛난 음식이 아니라아빠의 손을 잡고 사과나무 과수원뒷 언덕까지만 갔다 오는 게 소원인 아이들장독대에서 감나무 밑까지 자전거만 밀어 줘도진종일 신이 나는 아이들 곁에저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그러나 오늘 아침 눈물로 보리밥 한 덩이를 씹다가간절히 당신께 기원합니다.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씻어 주는바람이 되어 주시고들길에 넘어지면 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북돋우는 말씀이 되어 주시고말없이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당신의 사랑으로 크는 것처럼저의 아이들도 당신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품어 주십시오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 넣고주님, 오늘 아침 당신께 기도드립니다.-졸시 <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 넣고 > 중에서
시인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이탈한 자가 문득 > 램프를 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상력의 힘, 새로운 세계 / 이건청 (0) | 2010.12.18 |
|---|---|
| 시 쓰기, 시 앓기 / 김기택 (0) | 2010.12.18 |
| 시창작과 비평 / 오세영 (0) | 2010.12.13 |
| [강신주의 철학으로 세상 읽기]<6> 공공성과 타자의 존재 (0) | 2010.12.08 |
| [강신주의 철학으로 세상 읽기]<5>대표로 뽑힌 자와 뽑은 자의 괴리감 (0) | 2010.12.08 |
